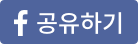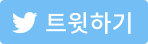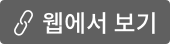화폐수량설을 위해 명목과 실질의 정의를 알아봅니다.
2022.01.04
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경제야 놀자’를 보시고, 경제의 눈을 키워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 오늘은 어느 분이 경제야 놀자 피드백에 ‘화폐수량설’에 대한 얘기를 부탁하셨더군요. 경제를 공부하는데 화폐수량설이 어렵다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화폐수량설’을 준비했습니다. (경제야 놀자는 많은 독자의 의견을 항상 듣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쓰다 보니 너무 길어져 1부와 2부로 나누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산식이 많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명목과 실질 화폐수량설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명목과 실질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생각해 봅시다. 예전 환율에 관한 뉴스레터에서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에 대해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에서 명목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와 다른 나라 화폐의 교환비율’이라고 했고, 실질환율은 ‘한 나라의 재화 또는 서비스가 다른 나라의 재화, 서비스와 교환되는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두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명목’은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이고, ‘실질’은 실물 단위인 재화와 서비스를 단위로 측정한 것입니다. 명목 단위는 단순하게 한 재화나 서비스를 달러 또는 원화로 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옥수수 1부셸이 2달러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 단위로 측정하면 다른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옥수수 1부셸이 2달러이고, 밀 1부셸이 1달러라고 해봅시다. 여기까지는 ‘명목’ 단위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를 옥수수와 밀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옥수수 1부셸은 밀 2부셸과 같습니다. 이것이 ‘실질’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가 사라지면서 비교한 것이 ‘실질’인 것이죠. 실질 단위에서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명목 GDP와 실질 GDP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명목 GDP는 단순합니다. 한 나라에서 하나의 물건만 생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2020년에는 그 하나의 물건을 1t만 생산하며, 그 가격은 1kg에 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2020년 GDP는 1,000kg X 1만 원 = 1,0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계산으로 ‘2020년의 명목 GDP’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비교 대상이 없으니 실질 GDP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2021년에 물가가 10% 정도 올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kg X 11,000원 = 1,100만 원으로 2021년 명목 GDP는 1,100만 원이 됩니다. 2021년의 명목 GDP 성장률은 10%입니다. 여기서 물가가 올랐지만, 생산량은 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같은 1t인 셈이죠. 실질 GDP를 계산하려면 기준연도를 정해야 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바로 1만 원이 기준이 되겠죠. 그럼 2021년의 실질 GDP는 1,000kg X 10,000원 = 1,000만 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물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량만 영향을 주는 것이 실질 GDP인 셈이죠. 만약 가격도 오르고 생산량도 올랐다면? 2021년에 생산량이 5%가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050kg을 생산할 것입니다. 물가 역시 5% 오르면 가격은 10,500원이 됩니다. 2021년의 명목 GDP는 1,050kg X 10,500원 = 11,025,000원이 됩니다. 전년보다 10.25%가 오른 셈이죠. 그런데 실질 GDP는 1,050kg X 10,000원(2020년 기준) = 1,050만 원으로 5% 성장한 것입니다. 이처럼 실질 GDP는 물가의 영향보다는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화폐를 기준으로 명목 GDP나 ‘명목 단위’를 계산합니다. 만약 화폐 공급량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명목 단위의 많은 지표는 화폐 공급량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 단위’는 화폐의 영향보다는 생산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화폐의 공급량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실질 GDP나 실질 임금, 실질 이자율 등은 화폐공급량과는 무관한 셈이죠. 추후 화폐 수량 방정식에서도 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만약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를 계산할 때도 명목 GDP와 실질 GDP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DP디플레이터라는 물가 지수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죠.
GDP디플레이터 식을 한번 볼게요. ‘GDP디플레이터 = 명목 GDP / 실질 GDP * 100’입니다. GDP디플레이터는 물가 측정의 한 방식이죠. 위에 명목 GDP와 실질 GDP를 대입해보면, (11,025,000원 / 10,500,000원)*100 = 105가 되어 물가가 5% 오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물가와 명목은 비례관계, 실질과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만약 물가가 올랐을 때 명목 단위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실질 단위는 반비례해 줄어든 것이고, 실질 단위가 변화가 없다면 명목 단위가 오른 것입니다. 명목 단위가 오르게 되었을 때 생산성이 변화 없다면 바로 화폐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2부에서 계속) (추가) ‘명목’과 ‘실질’이 붙는 모든 지표는 이런 관계를 가집니다. 임금도 마찬가지죠. 명목 임금은 그냥 그 해의 임금입니다. 현재의 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실질 임금은?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지난해의 임금이겠죠. A라는 사람이 2020년에 1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명목 임금은 100만 원입니다. 2021년에 물가는 5% 올랐습니다. 하지만 A는 2021년에 임금 인상률이 3%라고 가정합시다. 물론 한해 생산성이 3% 정도 상승한다고 가정한 것이죠. A의 2021년 명목 임금은 103만 원이 됩니다. 그럼 실질 임금은 얼마일까요? 103만 원 / 1.05 = 980,952원입니다. (GDP디플레이터(물가) 공식을 활용했습니다) 즉, 임금이 올랐지만, 물가 상승분보다 적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이처럼 명목과 실질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거시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이
뉴스레터를 카카오톡으로 공유하세요!
[문제] 다음은 갑국의 경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갑국의 기준연도는 2016년이다) ● 갑국은 2016년에 쌀만 10㎏ 생산했다. ● 갑국의 2016년 실질GDP는 100만원이다. ● 갑국은 2017년에 쌀만 10㎏ 생산했다. ① 갑국의 2016년 쌀의 명목가격은 알 수 없다. ② 갑국의 2016년 명목GDP와 실질GDP는 다르다. ③ 갑국의 2017년 명목GDP는 100만원이다. ④ 갑국의 2017년 실질GDP는 100만원이다. [해설] 2016년 갑국은 쌀만 10㎏ 생산했고 실질국내총생산(GDP)이 100만원이므로 2016년 쌀 가격은 10만원이다. 기준연도가 2016년이므로 갑국의 2016년 명목GDP와 실질GDP는 동일하다. 반면 갑국의 2017년 쌀 가격이 제시돼 있지 않으므로 현 자료만으로는 2017년 갑국의 명목GDP를 계산할 수 없다. 기준연도인 2016년의 쌀 가격 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갑국의 2017년 실질GDP는 100만원이다. 정답 ④ [문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하자. 이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화가치의 하락 ② 채권가격의 하락 ③ 통화량 증가율의 감소 ④ 총수요의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⑤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와 물가 하락 [해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금리가 해외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져 원화가치가 상승한다. 채권가격은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채권가격은 하락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과열된 경기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화량 증가율의 감소, 실질 GDP의 감소와 물가 하락을 이끌 수 있다. 정답 ①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COPYRIGHT ⓒ 한국경제신문 ALL RIGHT RESERVED. 수신거부 Unsubscri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