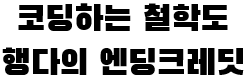젬매거진 4호가 도착했어요🎶 내용이 잘리니 반드시 클릭해주세요 👉 click gem magazine vol. 4 2021.04.07 gem magazine을 즐기는 꿀팁 대방출 🎉 1. 사용 디바이스별, 테마별로 이메일의 디자인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클릭하셔서 더욱 gem나게 읽어주세요 💗 2. 본문 속 푸른 글자는 링크입니다. 글자를 눌러 바로 해당 곡을 들을 수 있어요 👆 LP를 클릭해 👆 이번 호의 노래를 차례대로 들을 수 있어요 𝐠𝐞𝐦 𝐦𝐚𝐠𝐚𝐳𝐢𝐧𝐞 𝐯𝐨𝐥.𝟒 𝐩𝐥𝐚𝐲𝐥𝐢𝐬𝐭 1. 金子隆博 - たそがれの予感(황혼의 예감) 2. 金子隆博 - ナッキ-(nakki-) 3. 金子隆博 - ハルナとユ-ジのマンドリン(하루나와 유지의 만돌린) 4. 金子隆博 - メルシ-體操(메르시 체조) 5. 金子隆博 - タエコ, はじめてのかき氷(타에코의 첫 빙수) 6. Bill Haley - Rock Around The Clock 7. Elvis Presley - Heartbreak Hotel, Hound Dog, All Shook Up 8. The Beatles - Come Together(1969) 9. The Rolling Stones - Gimme Shelter 10. Mark Feng - Stop Asian Hate 11. 김민기 - 작은 연못 12. The Internet - Under control 13. Mamas gun - The spooks 14. Ruel x Cosmo's Midnight - Down For You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기가미 나오코(荻上直子)의 <안경> 나는 하찮고 무해한 유머를 좋아한다. 스스로가 ‘노잼’이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면 그 말을 수없이 들으며 살아왔기에 억울해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지만 쓸데없이 웃긴 것들을 좋아하는 취향을 가졌을 뿐이다. 오기가미 나오코(荻上直子)의 영화들은 대중들에게 가장 친숙한 <카모메식당>을 비롯해 그녀의 초반 필모그래피인 <요시노 이발관>까지 모두 쓸데없이 웃기고 따뜻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안경>을 처음 본 후에 ‘대체 이런 기괴한 유머를 여유롭게 구사하는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이지’라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기 시작했던 것이 <토일렛>을 제외한 필모그래피 전부를 관람하기에 이르렀다. ‘웃긴다’는 말을 반복해서 코미디 영화나 시트콤을 소개할 것이라 오해할 분들이 계실까 봐 노파심에 알려드린다. 한마디로 <안경>을 보다가 잠들면 제대로 관람한 것이다. 잠이 절실하던 때가 있었다. 무엇이라도 좋으니 할 수 있게만 해 달라고 빌다가 동이 틀 때쯤 지쳐 잠들기를 반년 동안 반복할 때 <안경>을 만났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잠들어 보고 싶어 별의별 방법을 시도해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거짓말처럼 영화가 시작한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기절하듯이 잠들었다. 일어나 남은 것을 이어 보며 “다 놓아버려도 괜찮다”라는 말이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고 마음속에 훅 들어와 자리 잡은 것을 깨달았다. 오기가미 나오코의 영화에는 주인공이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서사가 없다. 장르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대답하기 애매하다. 일상 드라마라기엔 놀라울 정도로 기복이 없다가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유머들이 있고, 그렇지만 코미디라기엔 재미가 없다. 심지어 같은 배우들이 감독의 다른 영화에서도 비슷한 역할로 출연한다. ‘이 무슨···. 자가복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놀랍게도 감독이 의도한 기묘한 악조건하에서 빛을 발하는 것들이 있다. 작품 사이에는 어떠한 세계관의 공유도 없지만, 배우들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마치 삶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어지듯 영화와 영화를 건너뛴 느낌이다. <안경>에서는 삶에 지친 주인공 역할인 코바야시 사토미가 <카모메식당>의 식당 주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고 '코바야시 사토미가 살다 지쳐 다 던지고 헬싱키로 떠나 식당을 차렸나 보군' 하며 혼자 즐거워하거나, <카모메식당>, <안경>, <요시노 이발관> 등에서 일관성 있게 속을 알 수 없는 역할로 등장하는 모타이 마사코가 반갑다거나, 감독의 모든 작품을 보고 나면 배우들이 다른 세상 사람이 아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된 것만 같은 착각이 든다. 이를 즐기는 단계라면 오기가미 나오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인사를 건네야겠다. <안경>은 세상 속 시끄러운 것들 다 집어치우고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곳으로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은 주인공 타에코가 낯선 바닷가로 떠나서도 좀처럼 마음먹은 것들을 버리지 못할 때 만난 특이한 사람들에 대한 영화다. 그들은 타에코의 긴장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방식으로 무너뜨린다. 일어나기 싫다고,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는 말 따위에는 아랑곳없이 타에코를 억지로 깨워 메르시 체조에 반강제로 참여시키고, 어리둥절한 타에코에게 대뜸 최고의 팥빙수를 권하기도 한다. ‘나도 너만큼 힘들어 봤어’ 혹은 ‘나도 네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 또는 ‘네가 어떤 기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를 응원해’ 등과 같은 위로 대신 “네가 어떤 상태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니 짐을 내려놓든 말든 알아서 하쇼” 하고 저마다의 여유를 즐긴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이, 이 바닷가 마을에서는 황당하게도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된다.
<안경>의 메르시 체조 OST 역시 단조롭고 엉뚱하다. 음악감독 카네코 타카히로(金子隆博)의 사운드트랙은 따뜻한 판타지인 <안경>에 몰입감을 더한다. 주로 피아노, 피아노와 첼로, 어쿠스틱 기타와 만돌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악기를 사용해 배경을 풍성하게 채우기보다 파도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풍경 소리와 같은 백색소음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단조로운 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카네코 타카히로의 음악은 관객이 일상과 동떨어진 특이한 바닷가 마을에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한다. <안경>이 슬로우무비, 힐링무비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데는 음악감독의 공이 크다. 사운드가 모자랐다면 다큐멘터리가 되었을 것이고, 과했다면 새로운 종류의 스릴러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엉뚱함을 추구하는 오기가미 나오코의 영화에서, 영화의 색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훌륭하게 공백을 메우는 음악감독이야말로 극한직업이 아닐까. ‘황혼의 예감(たそがれの予感)’은 영화를 대표하는 OST로, 피아노와 첼로가 두 축을 담당한다. 피아노 선율로 시작해 첼로가 더해지고, 스피카토 합주가 멜로디를 받치기 시작하는 부분은 듣는 이의 국적을 불문하고 어린 시절에 일본 바닷가 소도시의 여름을 즐기며 자랐던 것만 같은 기억을 심어준다. 동양과는 거리가 먼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고즈넉한 멜로디에서 <궁>의 OST로 유명한 뮤지션 ‘두 번째 달’이 떠오르기도 한다. ‘nakki-(ナッキ-)’는 어쿠스틱 기타와 만돌린의 조합이 인상적인 곡으로, 하와이에 가본 적은 없지만 하와이의 석양을 바라보며 듣기에 좋은 노래일 듯하다. <안경> 특유의 따뜻한 색채가 어쿠스틱 기타라면, 타이밍을 예측할 수 없는 엉뚱한 요소들은 만돌린 같다. ‘하루나와 유지의 만돌린(ハルナとユ-ジのマンドリン)’은 민박집 주인 유지와 하루나가 함께하는 만돌린 연주다. 바닷가에 위치한 사쿠라의 빙수 가게 앞에 걸터앉아 무심하게 연주하는 만돌린 연주를 들으며 바다를 바라보자면, 이국적인 만돌린 소리와 파도 소리의 조화에서 휴양지의 낭만을 느낄 수 있다. 쇳소리가 섞여 다소 탁한 만돌린의 현 튕기는 소리에서 마음의 안정 역시 찾을 수 있다. 기타와 우쿨렐레가 휴양지의 낭만을 노래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면 만돌린의 정제되지 않은 거친 소리에는 갈 곳 잃은 마음을 붙일 수 있는 무게 또한 있다. 빙수 가게 앞 사쿠라와 만돌린을 든 유지 안경의 대표 이미지인 메르시 체조에도 동일한 제목을 가진 곡이 삽입되었다. 체조에 맞추어 곡이 만들어진 것인지, 혹은 그 반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노래에 맞춰 우스꽝스러운 체조를 진지하게 하는 장면이 <안경>의 하이라이트다. 체조와 잘 어울리는 단순한 멜로디가 귀엽다. 리듬에 따라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체면 따위는 버리고 함께 춤을 출 수 있을 것만 같다. ‘타에코의 첫 빙수(タエコ, はじめてのかき氷)’는 타에코가 사쿠라의 팥빙수를 처음 맛볼 때 흐르는 음악으로, 음악감독 카네코 타카히로가 직접 연주했다. 오종종하게 통통 튀는 왼손 반주가 생기를 찾은 타에코의 마음 같아 심장이 몽글몽글해진다. 피아노로 시작해 첼로로 풍성함을 더하는 곡의 전개가 마치 타에코가 스스로의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바닷가 마을의 일상에 스며드는 과정을 표현하는 듯하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안다. 제 한 몸 건사하기 위해 정신 바짝 차리고 싫은 일들도 때로는 무찔러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삶이 하기 싫은 일들을 꾹 참고 버티는 나날로 가득하다면, 자유와 행복이 남의 일인 것만 같다면 잠깐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용기를 내보면 어떤가. 이를 용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얄궂고 슬프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라는 말 대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은 최소한의 위로다. <안경>이 힐링무비인 이유는 자유를 찾아 떠나라는 말이 무책임하게 들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지만, 106분 정도는 스스로를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는 데 투자해 보는 것은 어떨까.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놓아보고 싶었던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져버리는 이상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편히 쉴 수 있으리라 장담한다.  안경 Megane 감독 오기가미 나오코(荻上直子) 음악 카네코 타카히로(金子隆博) 개봉 2007.11.29 장르 코미디/드라마 등급 전체관람가 러닝타임 106분 수상내역 51회 샌프란시스코국제영화제
호우! 자유로운 영혼들 모이세요~~ ROCK의 역사 1 ~ 블루스에서 제1차 브리티시 인베이전까지 ~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3주 만에 보네요. 벚꽃이 만개했다가 졌어요. 어쩜 해마다 봐도 질리지 않는지. 꽃은 정말 예쁘고 싱그럽고 놀라워요. 저는 원래 ‘Rock’에 대해 쓸 생각이었습니다. 하위 종류가 많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정말 방대한 정보들에 넋을 놓고 한참을 멍하게 있었답니다. 이번 호 장르 글 제목이 좀 고등학교 역사 수업 절대 의도하지 않습니다만 불가피했어요. 최대한 핵심적으로 간단히 풀어썼으니(?) 괜찮을 거예요. 저는 사실 발음을 ‘락’이라고 하거든요. 락 페스티벌도 다들 ‘락페’라고 하지 ‘록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외국어 표기법상 ‘록’이 맞다니, 저도 이곳에서는 록으로 쓰도록 할게요. 먼저 고전적으로 시작해보고자 비틀즈를 찾아봤어요. 왠지 그들이 시작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에… 제 짐작은 정확하진 않았지만 얼추 비슷했습니다. 그분들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정말 다양한 음악을 하셨는데 그중에 록만 보자면, 팝 록, 사이키델릭 록, 아트 록, 펑크 록, 하드 록, 프로그레시브 록, 블루스 록,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숨을 고르고 차근히 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호에 다 할 수는 없고, gem에서 모두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umm.. uh..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리하고 해석해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 우선 록이라는 가장 커다란 이름부터 가보자고요. 록의 기원에 대해서는 1950년대 ‘로큰롤’에서 발원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 대부분의 음악 장르를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블루스가 나오지만 너무 근원적인 이야기라 보통은 로큰롤에서 기원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1940년대 말부터 1950년대에 블루스가 스윙 재즈의 영향을 받아 리듬 앤 블루스(Rhythm and Blues = R&B)라는 새로운 장르가 만들어졌어요. 이 장르가 초기 로큰롤의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많은 가수들이 흑인이었고 10대들은 흑인 음악에 너무 익숙했으며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것에 목말라 있었어요. 그때 빌 헤일리라는 백인 가수가 1954년 리듬 앤 블루스 흑인 뮤지션이었던 빅 조 터너의 ‘Shake, Rattle and Roll’을 커버한 것이 큰 관심을 받게 되지요. 이듬해에는 그의 밴드, ‘빌 헤일리와 커멧들(Bill Haley & The Comets)’의 ‘Rock Around The Clock’이 영화 <폭력 교실>에 실리며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당시 전국의 폭주족들의 가죽 재킷마다 그의 밴드 이름이 새겨질 정도였다니까요. 이어서 기타리스트 척 베리(Chuck Berry)가 등장해 새로운 기타 주법을 선보이고, 리틀 리처드(Little Richard)는 격동적인 피아노 연주를 보이며 리듬 앤 블루스는 서서히 로커빌리(rock-a-billy)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리듬 앤 블루스에 컨트리가 가미된 음악으로, 록과 힐빌리(hillbilly)의 합성어에요. 힐빌리는 미국 중남부 애팔래치아 산맥에서 부르던 컨트리 음악을 이르던 용어이자 남부 지역 사람들을 ‘시골뜨기'나 ‘촌놈'처럼 부르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촌스러운 느낌을 벗어나고자 10대들은 ‘로큰롤’(Rock and Roll)이라는 속어를 대신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쯤 되자 슬슬 흑인 목소리의 백인 가수가 나타나면 완전 히트를 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흑인 음악이 인기 있었고 흑인 가수만 가득했기 때문이죠. 백인이었던 빌 헤일리가 그 소문의 가능성을 열었지요. 그러다가 1955년,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름은 들어봤을 엘비스 프레슬리가 등장하고 그는 그 소문에 부합하는 가수가 되어 역사에 길이 남을 상업적 성공을 거둡니다. 🎧 빌 헤일리의 ‘Rock Around The Clock’ 빌은 이 노래 이후 엘비스와 다른 록스타들에 의해 이전보다는 묻히게 됐지만, 이 노래는 로큰롤의 본격적인 문을 연 아주 중요한 곡이 되었지요. “밤을 새워 록을 즐기자”라는 가사에 10대들은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Heartbreak Hotel’이라는 노래로 1956년 1월 미국에서 첫 RCA(Radio Corporation of America) 싱글 1위를 달성했어요. 저는 1968년, 그가 군에서 제대한 후의 컴백 무대 영상을 가져왔는데 다른 두 곡이 더해진 메들리입니다. 엘비스는 머리에 기름을 쫙 바른 채, 단추 몇 개 푼 가죽 재킷을 입고, 다리를 딱 벌리고 서서 노래하죠. 능글맞은 눈빛을 쏘면서요. 전 느끼하게 느껴지지만 당시 소녀 팬들은 함성을 질러요. 이런 게 로큰롤의 정석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어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지 알 것 같지 않나요?😂 이 로큰롤은 1955년부터 1958년까지 전성기를 맞이하고 나서 각종 사고와 탄압을 맞이하게 됩니다. 좀 껄렁껄렁하게 멋을 부리는 스타일이라 기성세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반항과 자유를 크게 노래하니 더욱 그랬겠죠. 그러던 차에 로큰롤 뮤지션들 사이에서 마약과 뇌물, 법적 및 도덕적인 여러 사건이 터졌고, 장르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자 엘비스 프레슬리는 바른 청년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자진 입대(!)를 선언합니다. 또 젊은 로큰롤 뮤지션 세 명이 사고로 세상을 뜨며 로큰롤 판은 유망주도 잃고 빠르게 종식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로큰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시기에 영국에서는 여전히 로큰롤의 열기를 잊지 못한 청소년들이 남아있었고, 그중 ‘쿼리맨’이라는 고교 스쿨 밴드로 시작한 몇몇 소년들이 비틀즈가 되어 미국으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사라지는 로큰롤을 보며 슬퍼했던 미국 10대들이 바로 이 비틀즈에 열광적으로 호응하기 시작하지요. 비틀즈가 로큰롤만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기반에는 로큰롤이 깔려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 다시 로큰롤이 부흥하기 시작했고 이후 록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또 영국 로큰롤 밴드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어서 롤링 스톤즈(The Rolling Stones), 애니멀스(Animals) 등등 여러 영국 밴드들이 미국으로 넘어와 활동하게 되었어요. 이때가 1964~5년경이었지요. 1960년대를 통틀어 제1차 브리티시 인베이전(British Invasion)이라고 불러요. 대중음악사에 중요하게 기록된, 영국의 록 음악이 미국 음악계에서 큰 성공을 얻은 시기랍니다.
1964년, 에드 설리반 쇼(Ed Sullivan Shows)에 출연하기 위해 미국에 온 비틀즈. 브리티시 인베이전의 시작이다. 🎧 비틀즈의 'Come Togeter' 네 명 나란히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는 그 유명한 앨범. 바로 비틀즈의 <Abbey Road>의 수록곡입니다. 비틀즈는 그다음 해인 1970년에 해체했는데요. 분열되는 분위기를 어떻게든 다시 모아 보자, 다시 해 보자는 의미로 담은 게 아닐까 싶어요. 웃긴 게, 2절에 가사에 코카콜라가 나오는데 특정 상품을 광고한다며 BBC에게 금지곡 판정을 받았지만 사실 이것은 코카인을 의미하는 것이었대요. 🎧 롤링 스톤즈의 'Gimme Shelter'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나타낸 사회적 색채가 짙은 곡입니다. 롤링 스톤즈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며 굉장히 세련됐다는 평을 많이 받아요. 그나저나 ‘브리티시 인베이전’이 왜 1차냐고요? 그야 당연히 2차가 있기 때문이죠😊 이번 호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2차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록 중에서도 제가 가장 흥미 있는 건 얼터너티브 록이랍니다! 이걸 말하려니 가볍게라도 뿌리부터 흐름을 한번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엄쥐의 록의 역사 1부 어땠나요, 여러분? 네 너무 좋았다고요~~?😉 히히 감사해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StopAsianHate 여행자로서 느낀 불편함 정도로도 부들부들 떨렸다. 잘못한 것 없이 몸 둘 바를 몰랐다. 유럽의 어느 시골에서, 동양인을 처음 보는 모양인지, 사람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으로 훑는다든지, 미국의 거리를 걷고 있는데 캣콜링을 하며 웃어댄다든지. 사소하다면 사소한 그런 사건들에서 느낀 불쾌함도 쉬 떨쳐지지 않았다. “참을 만큼 참았다.”, “적당히 좀 해.”, “그만 좀 해.” 그들이 든 피켓 문구(“Enough is enough”)를 보니 겹겹이 쌓인 시간 속에서 분노가 누적되다가 드디어 터진 것 같았다. “Stop Asian Hate”(아시안 증오 범죄 반대) 운동에 이 구호를 들고나올 때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억하심정이었을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불안하고 불편해진 사람들 앞에, 이를 ‘중국 바이러스’나 ‘우한 바이러스’로 부른 트럼프 전 정부의 시각이 더해졌고(어떤 이는 이에 더해 쿵플루(kung fu+flu)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이후 은근했던 아시아 차별이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곧 증오 범죄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3월 17일에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십 대 백인 남자, 애런 롱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아시안이 운영하는 3개 마사지업소에서 총을 난사해 여덟 명이 죽은 것이다. 이들 중 일곱 명은 여성이었고 네 명이 한국인이었다. 범죄자가 아시안이 운영하는 업소만 노린 것과 SNS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라 칭하며 “중국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올린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증오 범죄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경찰 대변인은 그날을 “a really bad day”(그에게 정말 나쁜 날)였다고 말했다. 나쁜 날이라고? 사람이 죽었는데? ‘백인이 죽었어도, 더 나아가 백인 남성이 죽었어도, 더구나 다른 인종에게 죽었어도 그리 말했을까? 그 무책임하고 가벼운 발언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3월 마지막 주말, 미국의 뉴욕, 엘에이, 시카고 등지에서 아시안 증오 범죄 규탄 집회가 열렸다. 아시안의 얼굴을 한 집회 참가자의 마스크에는 “I AM NOT A VIRUS”라고 써 있었다. 그걸 본 순간 문득 지난해에 본 “AM I NEXT?”(다음은 내 차례인가?)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1년 전쯤,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며 죽었을 때, 미국 전국에서 흑인 과잉 진압 반대 집회가 열렸고 이를 기사로 보면서 나는 이 문구에서 잠시 멈춰서 숨을 골랐다. AM I NEXT?, AM I NEXT? AM I….
태국과 인도네시안 뿌리를 가진 아만다 핑보드히파키야의 그림에는 강렬한 느낌의 AAPI(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아시아 태평양계)들의 초상화와 함께 증오 발언들이 함께 쓰여 있다. 버스 정류장 등 공공장소 곳곳에 붙은 그의 그림을 보며, 거기에서 뿜어 나오는 생명력과 당찬 에너지에 힘이 났다. 내가 다음 타깃이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공포와 불안이 얼마나 사람을 위축시키고, 어떻게 사람을 좀먹을 수 있을까. 다음 타깃은, 정말로 나일 수 있었던, 그곳에 살고 있었다면 나일 것이었던, 아시안이 되었다. 그 이유가 내가 바꿀 수도, 어쩔 수도 없는 나의 어떤 부분 때문이라면. 예를 들어, 성 정체성이나 피부색 같은 부분이라면, 그저 맞거나 피하는 것 외에 무얼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혐오와 증오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씨앗은 아주 작은 편견, 낯선 것에 대한 거부,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고 나만이 옳다는 오만함일 수도 있다. 이것은 그저 일상 언어에도 드러날 수 있다. 한때 ‘살색’이라고 불렸던 크레파스 색을 ‘살구색’으로 바꾼 것에 나는 박수를 보냈다. ‘근동’이라는 말은 누구의 기준에서 하는 말인가? ‘유색인종’이라는 말은 있고 ‘무색인종’이라는 말은 없다. ‘블랙 가스펠’은 있지만, ‘화이트 가스펠’은 없다. 대신, 백인의 가스펠을 ‘서던 가스펠’이라고 부른단다.(이는 지난 3호 ‘장르 연구실’에서 소개되었다.) 단일민족으로 오래 살았던 우리는 타인종, 타국적 사람들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체득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인지. 일하러 온 제3세계 노동자들을 마구 대한다든지, 다른 나라에서 온 누군가가 “이런 행동은 인종차별적으로 오해될 수 있다”라고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 쌍심지를 켜고 반발한다. 이제는 다양한 의견을 내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인종으로, 국적으로 위협을 당하는 게, 지구 반대편에서, 바로 지금, 우리 한국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말이다. 그건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벌이고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지난해 흑인이 외쳤던 “Black Lives Matter”(BLM: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가 떠오른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외쳐야만 했던 그말이 우리의 말이다. Asian Lives Matter. 그리고 All Lives Matter. You get treated like a virus you do if you happen to look like us They hurt the weak the old the voiceless Have you ever had to translate to mom and dad racist words Asian slurs targets on their backs Have your folks told you to just walk away “let it go, it’s ok, it’s always been that way”… There’s no official language in the USA… We’re all immigrants unless you’re indigenous So when you’re told to go home tell’em “lead the way” We have been translating all our lives their bills, taxes, our protective lies Words hurt lives our folks are threatened with knives Our voice is the only thing they have to fight So speak up, stand together, stop the hate 만약 네가 우리처럼 생겼다면 바이러스처럼 취급받을 거야 그들은 약한 자들을 해쳤고 늙은이들은 목소리를 잃었어 엄마 아빠에게 통역해 본 적 있어? 아시아인을 비방하는 인종차별적 단어들이 항상 그들을 겨냥하는데 부모님이 그냥 가자고 하셨어? “나 둬 괜찮아 항상 그랬는데 뭘” 미국에는 공식 언어가 없어… 네가 토착민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이민자야 그러니 집에 가란 말을 들었을 때 (어디로 갈지) “앞서”라고 말해 우리는 평생 번역하며 살았어 그들의 청구서, 세금, 보호 거짓말 우리를 칼로 위협하며 생명을 해치는 말들 우리의 목소리만이 그들이 싸울 유일한 것이야 크게 외쳐, 함께 서서. 증오를 멈추라고. 💿 Mark Feng의 'Stop Asian Hate'
♡오팔 씨가 김민기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여기는 지금 새벽 네 시 반입니다. 새벽 두 시에 눈이 떠져서 선생님 음악을 틀어 놓고 앉아 몇 해 전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하신 걸 보고 나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글로 읽어도 목소리로 들리는 것 같은 그 이야기들을 보니 그냥 가만히 앉아있게만 됩니다. 여태껏은 한 번도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기사 같은 걸 찾아보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라면서 우연히라도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본 적이 없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피하고 사셨다면 혹시 못 본 인터뷰가 있다 하더라도 별말씀을 하셨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생님을 잘 모르지만, 어느 사진 한 장의 표정에서도 친절하게 이러이러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았고, 어떤 연유로 어떤 세월을 살았는지 말하지 않아도 그 노래 안에 그 목소리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기자나 평론가들이 선생님의 노래를 이야기할 때면 지레 이럴 것이다고 생각하고 피했습니다. 사회의 부조리함을 알리는 집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선생님의 노래 때문에 민중가요의 대부쯤으로 만들어 꼭 어떤 정치사상과 맞붙어서 선생님의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게 답답했습니다. 다른 시절을 살았다면 노랫말이 달랐을까요. 젊은 시절 그 고초를 겪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사는 모습과 많이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는 선생님을 탄광촌에서 만났을 것 같고 농촌에서도 만났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절을 살아도 그런 마음이 그런 삶이 노래가 되고 그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노래에 정답이 담긴 것처럼 많은 이들이 서로 어깨를 얼싸안고 부르는 노래는 선생님이 나직하게 불렀던 그 노래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채로 그저 음악만 줄곧 들어왔습니다. 몇 주 전, 뒤늦게 ‘아카이브K’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방송이었는데 이럴 수가 있나 너무 반갑고 어쩔 줄을 모를 만큼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 자주 볼 수 없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있었습니다. 한 분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다 모여서 나오는 방송이 있나, 나를 보라고 만든 방송도 아닌데 이럴 수가 있을까 했는데 '학전'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가수들이었습니다. 배울 학學, 밭 전田. 선생님이 만든 작은 밭을 같이 일군 그분들의 음악은 사춘기 시절 나만이 어딘가에 동떨어진 것 같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올 때 중학생이었다고 하면 저 또한 BTS 세대에게는 옛날 사람처럼 느껴질 테지만 그때 동물원을, 여행스케치를, 권진원의 음악을 듣는 친구들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어볼 기회는 더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선생님이 가장 노래를 많이 만들었던 그 나이를 저도 지나면서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잊지 못합니다. 지금의 내 나이의 다른 시절을 살았던 이의 목소리, 한 세대의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 지내는지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고 싶을 만큼 마음은 가까웠습니다. 인터넷의 인물 검색에 선생님의 이름 석 자를 적어봤습니다. 1951년 3월 31일 출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이 2021년 3월 31일이니 칠십 번째 생일을 맞으셨겠네요. 검색창에 올려진 선생님의 사진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일관하지만, 툭 치면 웃으실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인터뷰 마지막 사진에 어색해 죽겠으니 빨리 사진 찍으라는 그 표정이 정말 선생님 모습이라 느껴집니다. 가끔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하냐는 질문에, 앞으로 기타 치며 음악을 하실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미쳤어"라는 간단한 말은 더는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고요. 저는 몇 해째 다른 나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국에 돌아간다면 선생님이 올린 아동극을 보러 아이와 나서려고 합니다. 어떤 논리를 떠나 이런 것 정도는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적자만 계속되더라도 만들고 있다는 어린이극. 이런 게 낫살 먹은 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그 극을 보러 때마다 학전을 찾으려고 합니다. 십여 년 전 좁은 계단을 내려가 학전의 사무실에 잠시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안 계셨지만, 혹시라도 사무실로 들어오실까 싶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린다면 건성으로 눈인사만 하시고 자리를 피하실 것 같았고 그렇다고 팬입니다 하면 더 어색할 것 같아 상상만으로도 머쓱해져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와 학전을 찾을 때는 어쩐지 분위기 좋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인사드려라 하는 소리로 제 인사를 대신하고 그러면 제 아이를 보고는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날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70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에디터 주) 오팔 씨가 소개한 김민기 씨의 노래는 ‘작은 연못’입니다.
💻 The Internet의 Under control 💿 앨범커버를 눌러 노래 듣기 💿 투투투투투투투투 하는 도입부를 듣자마자 “찢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Under control은 행다의 새내기 시절 발매된 The Internet의 앨범 <Ego Death>의 타이틀 곡으로, The Internet의 은은한 매력을 가장 잘 드러낸다. 경쾌하지만 절제되어있고, 가볍지 않지만 묵직하지도 않다. 정적이고 나른한 보컬과 경쾌한 리듬의 조화에서 서양판 정중동의 미학(?)을 상상하게 된다. 그루브의 폭이 크지 않은데 존재감이 강력한 것이 특별하게 들려 자신감이 부족할 때 찾곤 했던 곡이다. 잔잔한 그루브를 따라가다 보면 홍진경 씨의 꼬물대는 파리지앵 춤이 생각나기도 한다. 내적 댄스를 부르는 곡이다.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용기가 필요한 세상의 모든 새내기들에게 Under control을 특효약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노래만큼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 🔫 Mamas gun의 The spooks 🌟 Ruel x Cosmo's Midnight의 Down For You 💿 앨범커버를 눌러 노래 듣기 💿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 낙원상가 옥상 공연장이나 오래된 을지로 상가 꼭대기같이 도시가 내다보이지만, 어쩐지 너무 세련되지는 않은 곳에서, 석양이 질 무렵, 노래하고 연주하며 즐거워하는 이들을 보자니, 음악이 없으면 어찌했을까 싶다. 갑작스레 너무 더워져 버린 봄날에 조금 당황스럽지만, 지금 한창 아직 꽃이 만개했으니 조금 더 이 ‘달달구리’한 기분을 지속하고 싶다. 맘에 꼭 드는 누군가가 나에게 “Down For You”(너에게 빠져 버렸어)라고 속삭이는 것 같은 이 기분. 잘 준비된 공연도 좋지만, 이 뮤직비디오에서처럼 편한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자기들끼리 막 즐기는 것 같은, 연주를 훔쳐보는 것도 좋다. 마치 합주하는 공간에 함께 있는 듯하다. 인위적인 것이 없어 보여 좋다. 어서 마음대로 공연을 보고 공연하는 날들이 오기를 기다려 본다. 그때는 마스크 없이 봄바람을 마주할 수 있겠지. 젬 매거진 gem.officialcontact@gmail.com 수신거부 Unsubscri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