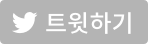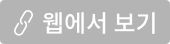💌 2021 성북 N 작가공모의 과정을 공유합니다!
🌼 황아일 작가 인터뷰 🌼 오늘 《땡땡레터》는 ‘2021 성북 N 작가공모’에서 땡땡 콜렉티브와 매칭팀이 되어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황아일 작가님과의 인터뷰입니다. 《구름 그림자》에서 선보이는 작품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와 그 속에서 드러나는 황아일 작가님의 가치관이 담겨 있으니, 즐겁게 읽어주세요! Q. 안녕하세요, 황아일 작가님.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땡땡레터》의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끊임없이 실험하며 경계를 확장해 나가는 작가입니다. Q. ‘2021 성북 N 작가공모’ 《구름 그림자》 참여작을 소개해주세요. 이번 공모 참여작은 〈검은 숲〉, 〈85개의 회화 조각〉, 〈물음 조각〉, 〈재건축 Ⅳ〉,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된 〈풍경〉입니다. 5개의 작품은 떼어내거나, 접거나, 비우는 등 일종의 해체 과정을 통해 다양성과 변화를 끌어내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과 일상의 연속성, 재료의 가변성과 작가가 더하는 물리적 변경, 작가와 관객 사이 등 작품을 둘러싼 여러 경계를 허물고 모호하게 하는 작품으로 4개의 설치 작업이 소개되었습니다. Q. 〈검은 숲〉, 〈85개의 회화 조각〉은 모두 라텍스페인트(latex paint, 합성 라텍스와 색소를 섞은 도료)를 사용해요. ‘라텍스페인트’라는 미술 재료/매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점에서 이 매체에 끌렸나요? 2010년에 독일에서 건물 유리창을 위한 작품을 구상하다가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혔어요. 유리창에 무언가를 바르고 나서 전시가 끝난 후 이전 상태로 복구가 가능한 페인트 재료를 찾다가 라텍스페인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내용과 별개로, 작업하는 환경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이나 결핍이 작품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라텍스페인트’라는 재료가 지지대에서 떨어진 후 다양하고 유연하게 형태를 변화할 수 있다는 점, 일상적이고 간단한 재료라는 점에서 끌렸습니다. Q. 〈검은 숲〉에서 라텍스페인트를 유리판에서 떼어낼 때,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훼손 정도를 최소화하려는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황아일, 〈검은 숲〉, 2021, 5개의 유리판, 라텍스페인트, 각 195×71cm. ⓒ 성북예술창작터 (촬영: 최요한) 사실 훼손 정도를 최소화한다기보다는 라텍스페인트가 유리판 위에서의 본 모습을 담고 있도록 노력하는 편에 가까워요. 제 이전 작업 중에서 유리창에 붙어 있던 라텍스페인트를 다 떼고, 이를 가루로 모은 게 있어요. 라텍스페인트가 가루가 되어 바닥에 펼쳐져 있고 그 앞에 유리판이 세워져 있을 때, 라텍스페인트와 유리판의 관계가 〈검은 숲〉에서의 라텍스페인트와 유리판의 관계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검은 숲〉은 라텍스페인트가 유리판과 비슷한 모양으로 떨어져 있거나 표면에 구멍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 간격을 조절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검은 숲〉은 그 대비의 거리를 좁혀서 표현한 것입니다. Q. 지금까지는 라텍스페인트를 어딘가에 씌우거나 부어서 이를 굳히고 난 후, 작가님께서 직접 뜯고 그 결과물을 전시하여 보여주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85개의 회화 조각〉과 관련하여, ‘회화 조각’을 감상자가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죠.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황아일, 〈85개의 회화 조각〉, 2021, 라텍스페인트, 가변설치, 각 35×28cm.
ⓒ 성북예술창작터 (촬영: 최요한) 전시에서 라텍스페인트 작업을 관객에게 보인 건 총 네 번이에요. 그중에서 세 번은 라텍스페인트가 전시된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관객이 작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라텍스페인트를 칠한 유리창을 통해 안과 밖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스스로 그림자를 만들어보기도 하는 등 작품 안에서 체험이 저절로 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다른 체험을 추가로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이번 전시에서 〈85개의 회화 조각〉은 공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전시되는 만큼 관객에게 다른 방식으로 열린 작품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Q. 〈물음 조각〉은 ‘사고력도 조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신선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현에 옮기는 과정에서, 특히 ‘물음’에 어떻게 조각적 특성을 더할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액자를 활용하기까지 어떠한 고민과 과정이 있었을까요? 사고력과 조각에 관한 것은 요셉 보이스가 ‘사회적 조각’을 통해 이미 50년 전에 실천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현 미술계나 관객들에게 조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의 범위는 매우 좁다고 생각합니다. 〈물음 조각〉과 관련하여, 전시장 벽에 관객이 직접 질문을 쓰게 하는 초기의 아이디어는 평범해 보이는 크기의 액자 유리에 쓰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물질을 사용해 사고력에 중점을 둘지, 물음을 담는 조각적 요소를 사용할지에 관한 고민이 있었어요. 〈물음 조각〉은 액자가 보통 회화나 드로잉 작품을 담는다는 점에서 회화와 관계하기도 하고, 동시에 유리에 글을 쓰면 벽에 글씨의 그림자가 생겨서 조각적 요소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조각(Social Sculpture) ‘사회적 조각’은 요셉 보이스가 1970년대 발전시킨 이론으로, 모든 것은 예술이고 삶의 모든 면은 창의적으로 접근될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예술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개념을 토대로 한다. Q. 〈물음 조각〉이 이번 성북 N 작가공모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된 리뷰어 ‘땡땡 콜렉티브’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인상적인데요. 협업을 제안했을 때 어떤 기대가 있었나요?
황아일×땡땡 콜렉티브, 〈물음 조각〉, 2021, 유리 액자, 마카펜, 각 71×57cm. ⓒ 성북예술창작터 (촬영: 최요한) 처음 땡땡 콜렉티브와 매칭팀이 되었을 때부터 땡땡 콜렉티브의 관심사와 제 관심사가 교차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동작업을 할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고요. ‘물음 조각’은 구체적인 실현안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관해 공동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음 조각’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조각적인 부분을 맡는다면, 땡땡 콜렉티브는 연구 프로젝트 〈네오 라이팅 클럽〉을 통해 〈물음 조각〉의 내용적인 부분을 맡아서 좋은 공동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Q. 그리고 이은지 작가의 작품과 어우러져 전시되는 ‘재건축’의 새로운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름 그림자》에서 선보이는 〈재건축 Ⅳ〉를 포함하여, 재건축 시리즈가 고유하게 가진 특징 혹은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재건축’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제가 작업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무언가를 훼손하거나 해체하면서 나오는 변화, 다양성,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재건축(reconstruction)’이라는 말 자체가 해체(deconstruction) 과정을 함축하고 있어요. 시트지로 구성된 재건축 시리즈는 시트지만으로 완성되는 작업은 아닙니다. 작품이 배치된 주위의 환경, 빛, 관객 등 여러 요소가 작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작품(재료)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눈을 열어야 작품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Q. 독일에서 꾸준히 작업과 전시를 하셨고, 이번 성북 N 작가공모가 한국에서의 첫 공모 전시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작업하고 전시를 할 때, 독일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성북 N 작가공모’라는 공모전과 《구름 그림자》 전시를 준비하면서, 독일에서의 경험과 비교하여 많은 일정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1차, 2차 선정과정에서의 서류는 물론, 선정 후에도 여러 차례의 온라인 미팅, 큐레이터님이 작성한 자세한 프로토콜 등 행정적인 절차가 많아서 놀랐어요. 또한, 전시에서 보일 작품을 미리 상세하게 계획하여 초안의 80% 이상을 따라서 작업한 경험도 새로웠습니다. 독일에서 비슷한 규모의 전시를 했을 때, 주로 포트폴리오를 통해 작가를 선정하고, 전시공간을 보며 전시할 작품을 구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과 독일에서 이러한 점이 다르지만, 한국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문화와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의도적으로 물음을 가지고 되짚는 과정이 있다는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작가로서의 가치관에 해당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려 해요. 〈85개의 회화 조각〉과 〈물음 조각〉은 감상자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 〈재건축 Ⅳ〉은 시트지가 떼진 부분에 빛이 어떻게 투과하거나 반사하냐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합니다. 이는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최소한으로 제어하려는 시도로 느껴지는데요. 작업할 때, 작가를 최대한 지우고 전시공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평소 어떤 생각을 지니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작가의 존재를 최대한 덜어내는 행위는 작가로서의 가치관이기도 하고, 제 삶의 가치관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가 한 발짝 물러남으로써 생기는 공백은 결핍과 미완성이 아니라, 작품 스스로와 관객이 더욱 다양하게 채울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공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가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려는 노력보다 빈칸, 열린 장에서 새로운 시각을 나누는 게 더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 수연 황아일 작가님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뷰도 식후경’이라며, 카페에서 이것저것을 시키고 배를 채운 뒤 소소하게 웃으며 인터뷰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가님의 긍정적인 분위기와 작품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한 작가와 그의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일은 누군가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의 흥미진진한 대화가 구독자분들께도 최대한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이상 인터뷰 진행자 수연이었습니다! 소개 황아일은 일상적인 공간과 사물, 상황 및 관계를 일부 변경하거나 재조정하여 그 대상을 둘러싼 다층적 의미를 드러내는 시도를 해 오고 있다. 유동적인 재료를 활용하여 떼어내거나, 접거나, 비우거나 하는 방식의 해체를 거친 설치 작품을 통해 작품과 일상, 작가와 관객 등 여러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획일화된 기준과 동일성을 추구하는 관습에 맞서 고정되지 않은 시각으로 새로운 맥락을 구현하고자 한다. 황아일은 현재 서울에서 거주,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여자대학교 서양화과에서 학사학위를, 독일 뮌스터 쿤스트 아카데미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GAM》(2019, offraum 8, 뒤셀도르프, 독일), 《black and blank》(2018, Engelage and Lieder 갤러리, 뒤셀도르프, 독일), 《11.Arte Laguna Prize》(2017, Arsenal, 베네치아, 이탈리아), 《Ida-Gerhardi-Förderpreis》(2016, 뤼덴샤이드 시립 갤러리, 뤼덴샤이드, 독일),《Förderpreisausstellung》(2014, 쿤스트할레, 뮌스터, 독일) 외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다수의 전시와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오늘, 땡땡레터 어땠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