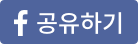Letter 6. 경계선을 만들고 또 넘어가는 일 경계를 넘어서야 보이는 또 다른 세계 나는 호기심은 많은데 안타깝게도 겁이 많은 편이다. 겁도 많고 걱정도 많다.
그래서 뭐든 처음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예상 가능한 영역 내에서, 아는 데까지만 정확히 보이는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편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잘 모르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본능적으로 두려우니까. 처음 따릉이를 타기 시작했을 때도 그랬다. 자전거로 내 마음의 선이 허락한 곳까지만 갔다. 여기부터 저기까지 경계를 나누는 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그 선을 넘으면 안된다고 금지한 것도 아닌데도 그랬다. 그러면서도 저 길을 지나면 어떤 풍경이 있을까. 어떤 길이 있을까. 매번 궁금해했다. 몇 날을 거친 내적 고민을 마치고 어느 날, 평소 따릉이를 돌리는 반환점을 지나쳐 앞으로 더 나아갔다. 그러다 마주친 고양이가 그려진 이정표. 휘황찬란하지도 않았고 잘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정도로 눈에 띄는 표지판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렇게 쓰여있었다. “어서오십시오. 고양시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렇다. 그 날 나는 마음의 선도 넘고 실제로 시의 경계도 넘었던 것이다.
그것 참 별 일도 아니네?
어릴 땐 하면 안 되는 일, 그냥 해야만 하는 일이 참 많았다. 여자니까 하지 말라는 일, 여자니까 해야 하는 일이 제일 이해가 안 갔고 동생이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하면 안 되고 해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갔다. 왜? 라고 물어보는 것도 허용이 안 됐다. 왜요? 라고 물어보는 애는 예의 없는 애였으니까. 정말로 궁금했다. 그건 누가 정한 건데요? 내가 왜 그걸 지켜야 하는데요?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하면 안 되는 일, 그냥 해야만 하는 일 투성이다. 대신 지금 나에게는 그것들을 안 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할 지 말 지 선택할 자유도 있다. 나는 때로 하지 말라는 일은, 왜? 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리고 하라는 일은, 왜? 난 그렇게 하기 싫은데?라고 생각하고 은근슬쩍 안 한다. (물론 이 일들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개인적인 범위 내에서.) 그러면 알게 된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일,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막상 (안) 해보니 걱정한 거에 비해선 별 거 아니었던 일도 있고, 무작정 (안) 했다가 혹독한 결과를 얻은 적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나는 나만의 경계를 만들고 있다. 이 경계는 누군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한 것도, 내가 나갈 수 없게 스스로 가두는 경계도 아니다. 다만 나를 안온하게 지키기 위한, 나를 납득시키기 위한 경계다.
경계는 결국 내가 그 경계를 넘어서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하지만 누구도 나에게 그 경계를, 한계를 억지로 넘어서라고 강요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정한 방식이 있고 내 속도, 나의 ‘때’가 있는 거니까. 물론 경계를 넘는다는 게 생각처럼 나를 어제의 나와 완전히 다른 나로 만드는 건 아니다. 자전거를 잘 못 타는 내가 자전거를 탄다고 해서, 자전거를 타고 멀리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자전거로 미지의 길에 도전한다고 해서 천지가 개벽하는 것도, 드래곤볼을 모두 모은 손오공처럼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오늘 이 경계를 넘은 나는 또 다른 경계를 넘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그러기로 정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어제와 그만큼 다른 나다. 🍈
🚲 이것은 경계 안일까 경계 밖일까. 물멍
🚲 경계. 여기와 저기 사이
🚲 시간의 경계. 강의 경계.
🚲 다시 안온한 경계 안으로
🚲
그리고 따릉이 _ 오늘의 글쓴이: 셀린 발행인🚲 따릉이로 한강을 달리는 셀린 @bluebyj 새로 산 브롬톤 라이더 루비 @w.chungmin 퇴근 후 자전거🚲 Copyrightⓒ 루비 / 셀린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