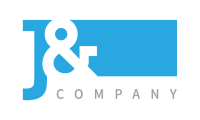J& COMPANY w/HRer Issue 4. 진단도구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생각 by jason, KIM 진단의 계절이 왔습니다 HR 분야에서는 진단의 계절이 연중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찬 바람 불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개인 단위의 진단, 즉 리더십 다면진단이나 역량진단(예: Assessment Center)이 성수기를 이룹니다. 이는 연말/연초에 이루어지는 인사평가, 승진,
조직개편 준비 때문에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함이죠. 또 한 번의 성수기는 바로 늦은 봄부터 초여름까지입니다. 이때는 개인 단위가 아닌 조직 단위의 진단이 주(主)를 이룹니다. 조직진단, 직원
만족도 조사, 기업문화 진단, 직원 몰입도 진단 같은 것을
많이 진행합니다. 이때가 아마 그해의 비즈니스가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보니, 현재 조직과 구성원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내서 HR 전반에 활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같은 컨설팅 회사들은 이런 진단 의뢰를 이틀 걸러 한 번씩 받을 만큼 바빠집니다.😱 (직장인 바쁜 짤을 넣으려고 검색했을 뿐인데...) 기존 진단도구들의 종류 시중에는 다양한 진단도구가 존재합니다. 진단의 목적, 측정 대상, 주제, 관점, 방법론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합니다. 컨설팅 회사의 개수만큼, 아니면 훌륭한 대학교수 및 연구자의
숫자만큼 존재할 것입니다. 각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는 것까지 더하면, 수천수만 가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각각을 다루는 것은 의미 없어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아래의 도구들도 더 세분화하면 개인의 '성격'을 측정하는 것이냐, '가치관'을 측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다 측정하는
것이냐로 나눌 수 있고, 조직 단위의 진단도구도 '회사 차원'의 거시적 도구이냐, '팀 단위' 소규모 조직 내 다이내믹을 보려는 것인지로 더 나눌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 정도로 상세히 분류하지는 않겠습니다. 개인 단위: Hogan, Berkman Method, MMPI-2, TCI, OCAT-C, Talent-Q, CPI, ILS(Inventory of Leadership Styles), PCI, DiSC, MBTI, 16PF(The Sixteen Personality Questionnaire), AB5C(The Abridged Big Five Circumplex), WPI, KEPTI(한국형 에니어그램) 조직 단위: OHI(Organizational Health Index), EES(Employee Engagement Survey), EES(Employee Effectiveness Survey), OCI(Organizational Culture Inventory), OCS(Organizational Climate Survey), CVF(경쟁가치모형) 이처럼 다양한 진단도구가 존재하니, 기업들은 각자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것을 찾아서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이 중 몇몇은 가격이 너무 비싸긴 하지만요…💸 이런 높은 가격 외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는 다소 일반론이 될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 많은 진단도구를
하나하나 다 다룰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기존 진단도구의 일반적인 문제점 첫째, 문항의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문항이 많을수록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고, 그 데이터에 여러 통계적 기법을 적용해볼 수 있으니, HR 담당자
입장에서는 문항을 많이 만드는 것이 유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사소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꽤 중요한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문항을 적게 만들어 가져가면, 의사결정권자(보통은 HR 담당
임원)가 “이 정도 문항으로 뭘 알아낼 수는 있겠어?”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문조사를 할
거라면 다다익선(多多益善)으로 접근하는 사례를 자주 봤습니다. 하지만 설문에 응답해야 하는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100개가 훌쩍 넘는 문항을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저 위에 있는 어떤
조직진단 도구는 풀세트 기준으로 문항이 400여 개에 달합니다. 회사에
대한 애정 또는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직원이라면 그 많은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하겠지만, 보통의 직원들은
응답하다 지쳐서 적당히 찍고 끝낼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대충 답할 것 같네요. 둘째, 문항을 이루는 문장이 너무 길거나 중문(compound sentence)인 경우가 잦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장이 길어지면 고급스러워지고, 그 의미를 응답자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문장이 짧고 간결할수록 의미가
잘 전달됩니다. 눈으로 쓱 읽어서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문항은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일반인이 한 번에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는 40자 정도라고 합니다. 이 뉴스레터 기준으로, 한 줄이 조금 넘고 두 줄은 안 되는 정도의 길이입니다. 생각보다 짧습니다. 위에 나열한 어떤 진단도구의 문항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문장이 무려 100자로 구성되어 있더라구요. 저조차도 그 문장을 여러 번 읽고서야 그 의미를 겨우 추정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영어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문장이 길어서 읽기 어려운데, 그 안에 들어간 단어/표현도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에 문장의 구조 자체가 2개 이상의
문장이 결합된 중문이면 너무 헷갈리게 됩니다. 앞 문장에는 동의하는데 뒤 문장에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도대체 어떻게 응답하라는 것인지… 셋째, 모든 문항을 무조건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합니다. Likert 척도가 가진 장점은 많습니다. 우선 통계 처리가 쉽습니다. 응답자도 이 방식의 설문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Likert 척도로 문항을 구성하면, 응답자 입장에서는
한 문항에 응답하는 시간은 짧아지지만, 그 대신 문항의 전체 개수를 상당히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 통계적 분석에 의해 결과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응답자가 이 설문 방식에 익숙한 만큼 또 진부하게 느끼기 때문에, 성의 없는 응답을 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일반적인 5점 척도를 쓸 경우에는 중심화
경향, 즉 모든 문항에 대해 웬만하면 3점을 찍는 경향성도
높아집니다. 넷째, 결과 분석 시 통계적 분석과 추정에 의존해야 합니다. 결과 분석 시 여러 통계적 기법(예: 회귀분석)이 들어가야 하고, 결국은 통계적 추정에 의한 결론이 맞는지 확인하는 추가적인 조사(예: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진단 결과가 타사와 비교했을
때 어때요?”라고 묻는 고객사가 많아지고, 결국 레퍼런스 및 Benchmark Index가 중요하니, 역사가 깊은 진단도구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위의 일반적인 문제점 네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만든 진단도구를 기업 현장에서 그대로 쓰니까 생기는 현상”이라고...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HR 담당자들의 긴 가방끈 때문에 대학/대학원에서 배운 학문적 틀을
깨고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사고력과 경험으로 새로운 무엇인가를 주체적으로 만들어
쓰는 것을 (학문적 근거 또는 레퍼런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좋은 진단도구를 선택·개발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좋은 진단도구를 선택∙개발하는 방법 첫째, 진단하고자 하는 대상과 주제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폭넓게 진단하는 도구가
가성비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결과 보고서를 받으면 해석이 어렵거나 중언부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진단의 목적, Target Group, 주제, 활용 방안 등이 초기에 잘 설계되어야 후속 작업이 편해지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좋아하는 (링컨 대통령의) 명언을 인용하고 싶네요. “나무를
베는 데 8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 데 6시간을 쓰겠다." 둘째, 가능하면 개별 문항의 샘플을 받아서 리뷰하십시오. 계약 체결 전에 전체 문항을
제공하는 곳은 드물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일부 대표 문항의 샘플이라도 받아서 보십시오. 이때는 HRer가
아닌 응답자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TV 예능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눈높이를
중학교 2학년 정도에 맞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콘텐츠가 그보다
어려우면 시청자층이 제한되고, 그보다 쉬우면 유치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경력 3~7년차 정도 되는 주임~대리급의 눈높이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셋째, Likert 척도를 너무 당연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Likert 척도는 여러 응답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척도형에 익숙하기 때문에 좋아 보일 뿐이죠. 실제로는 다양한 응답 방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양자택일형(Yes or No), 다중선택형, 우선순위형, 점수배분형, 강제선택형(Ipsative)
등이 있습니다. 진단의 목적/주제에 따라서 좀
색다른 응답 방식을 활용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응답자 입장에서는 흥미가 생기고 응답 시
몰입감이 높아지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진단을 꼭 설문조사 형태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볼 것을 권장합니다. 설문조사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연구자가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 대비 다량의 정보를 얻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조직 규모가 작거나, 얻어야 하는 정보가 아주 깊이 있는 것이라면, 설문조사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직원이 15~20명에 불과한 회사에서
조직진단 설문을 하고 싶다는 의뢰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그룹 인터뷰(FGI)나 워크숍, 아니면 1:1 면담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익명성 보장 때문에 설문이
필요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라면 그 상황에서 설문조사보다는 익명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넷째, 누구를 응답자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잘 생각해보십시오. 설문의 주제에 따라서 응답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원/팀장의 리더십을 진단해야 할 때, 그 진단 대상자의 리더십에 관해 제일 잘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일지, 아니면 그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후배 직원인지를 생각해보십시오. 전자(前者)라고 판단하면 자기보고식(self-report) 검사를, 후자(後者)로 판단하면 다면평가(진단)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
단위에서도 그 조직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싶은데, 조직문화가 보수적이라
누구도 솔직하게 답하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한다면, 현(現) 재직자가 아니라 최근 1년 내 퇴사자에게 묻는 대안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서비스를 <Exit Survey>라는
이름으로 고객사에 제공하는데, 퇴사자들로부터 깊고 솔직한 의견을 얻어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시 설문 방식(Pulse Survey)도 적극 검토해보세요. 개인 단위의 진단에서는 어렵겠지만, 조직 단위의 진단에서는 한방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번에 조사지를 뿌리는 “cannon-shot to the mass”(제가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공식적/학문적 표현은 아닙니다😛) 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추천합니다. 그 대안은, 일정 주기마다(매월
또는 분기별) 응답자 그룹을 새롭게 구성하고 그 표집에 소수의 문항을 보내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요인을 꾸준히 추적 관찰 또는 모니터링하는 Pulse Survey입니다. 이미 해외 기업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활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유독
우리나라 기업에서만 이런 방식을 이유 없이 불편해하더라구요. 한 예로, 어떤 회사에 이 방식을 제안했더니 HR 담당 임원이 “그 표집의 대표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라고 하던데… 사실 이 질문은 통계의 기초를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이지요. 아무튼
저는 이 Pulse Survey를 “periodic
single-shot to the sample”이라고 부르는데, 써놓고 보니 너무 기네요… 다른 표현을 구상해봐야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저는 HR 담당자들이 진단/검사/설문/측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길 바랍니다. 10여
년 전에는 해외 유명 학자 또는 컨설팅 회사가 만든, 겉으로 보기엔 멋지지만 우리 체형에 잘 맞지 않는
기성복을 억지로 입었다면, 이제는 각자의 체형 및 기호에 따라 맞춤복을 지어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빅데이터, AI의 시대이고, HR도 이러한 역량을 강화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이 아닙니까? HR
Analytics의 시작은 양질의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 가공, 관리, 분석하는 것일 겁니다.
HR 운영 시에 발생하는 정보(예: 인사발령
이력)도 중요하겠지만, 회사에서 하는 각종 진단이나 설문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도 HR Analytics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쓸 만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서 활용하려면, 그만큼 HR 담당자가 진단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여 준(準)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도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각 기업에 맞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기왕이면 ‘세상에 없는 우리만의 것’을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 지난 뉴스레터들을 보고 싶어요! 🥰 J& COMPANY 블로그로 놀러오세요! 😎 홈페이지도 있고, 😁 Linkedin 까지! 😊 J& COMPANY w/HRer 는 격주로 발행됩니다. 화요일 오전에 찾아뵐게요. |